서울 문래예술공단에 나타난 도시공간의 생산과 전유
2010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인 제목의 논문을 읽었다. 학부논문이 없어지고도 친구의 석박사 논문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내용이 영어인데다(!) 엔지니어 분야의 논리와 용어를 이해할 길이 없어 사실상 석사논문을 읽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논문을 준비하는 동생이 카메라를 빌려가면서 행선지를 밝혔던 바람에 두 줄 제목의 첫 줄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제목 둘째 줄부터 나타난 단어가 고민스러웠다. 전유.. 란 무엇인가. 목차를 훑고 논문이 크게 두 덩이로 나뉘어 이론적 고찰과 현재하는 공간에 대한 담론으로 구성된 것을 보고 무작정 읽어가기 시작했다.
도시의 자생적인 생산과 대립하는 反노동자적 기능의 자본주의 소비에 대해 적절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론을 풀어가는데 지리학 비전공자이지만 경제학 전공자(?)로서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전개였다면 논문을 제대로 읽어간 것일까.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여가로 해석되는 자본주의 소비와 거대화, 객체화가 비롯하는 상품가치로서의 공간 창출이 가지는 의미가 오래 잠자고 있던 경제학사로서의 의식을 잠깐이나마 깨워주어 좋았다. 아울러 자생해온 공간의 역사가 갖는 본질을 떠나 색다른 교환가치로서의 기능 부여에 주력하고 있는 ‘디자인 서울’ 정책에 대한 안목도 지리학 비전공자를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아쉬운 부분은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아냈어야 할 후반부에 있었다. 필자의 기획 의도와 수고가 엿보이는 인터뷰 방식의 서술은 살아있는 그들의 생각을 성공적으로 담아냈으나 각각의 인터뷰가 갖는 의미를 좀 더 조직적으로 엮어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그것은 아마도 인터뷰 방식 자체가 병렬적으로 의견을 청취함으로 말미암아 제약된 결과인 것으로 생각한다.
논문을 다 읽고도 끝내 ‘전유’의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그것은 순전히 전문용어가 배경으로 삼는 방대한 학문적 성과에 대한 독자의 무지로 치부하는 바이다. 그보다는 논문을 작성하면서 누렸을 풍성한 학문의 미궁에서 나름의 성과를 이뤄낸 동생에게 무한한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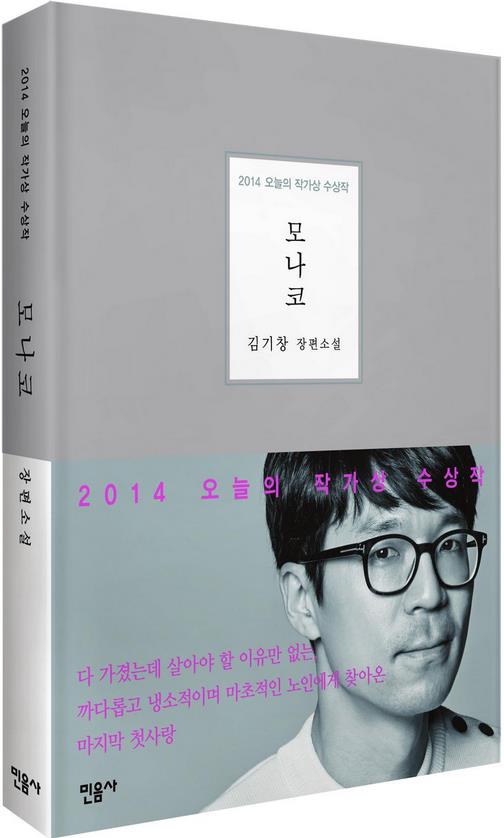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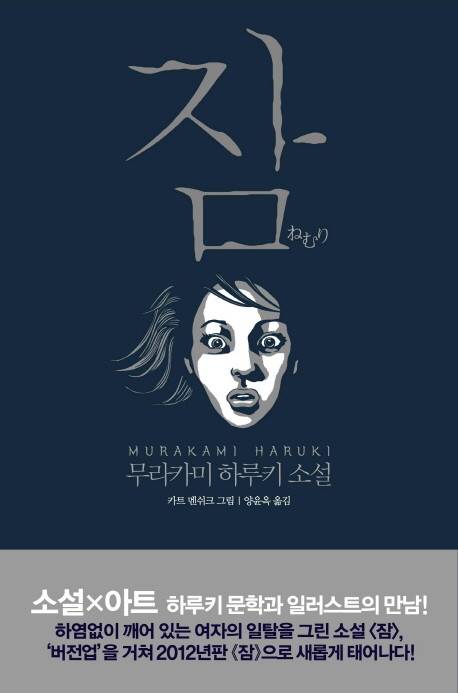








최근 댓글